사람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다. 어제 같이 먹자고 했던 파니는 자리에 없어서, 그냥 옆사무실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먹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럼요. 어서 와요, 같이 먹어요."
통성명을 하고 앉았는데 뭔가 모르는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다들 말이 너무 빨라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같은 몬트리올 사람이라도 사투리가 심하고 말이 유독 빠른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땐 대화의 토막토막, 단어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다.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부엌에 식기 세척기에 PVC가 붙어있으면 오래 가고 좋다, 강아지를 기르는데 마당에 나무로 만든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집을 사려면 모기지를 해야하는데 예산 짜기가 복잡하다...
정도가 알아들은 부분이고, 못 알아들은 부분이 더 많다. 와, 이거 무슨 듣기평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이 어렵지? 점심시간 대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조금만 지나면 이런 대화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
그런 점에서 우리 부서 사람들, 특히 내 상사 쟝이 나를 잘 신경써주고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쟝은 내가 빨리 이야기하면 못알아듣는 걸 알고 나한테 말할 때는 천천히 차분차분 말한다.
처음엔 '쟝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다 천천히 말해준 덕분이다. 좋은 상사를 만난 것 같아 다행이다.

한 동료가 피자를 시켰다. 도미노에서 시킨 제일 작은 피자였다.
"그거 한판에 얼마야?"
"22달러."
나도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기로 했다.
"팁도 포함해서요?"
"팁도 포함해서. 배달비가 4.4달러네."
"무슨 피자인데?"
"여기는 메뉴가 별로 없더라고. 그냥 멕시칸 피자야."
"아하..."
"난 페퍼로니는 별로 안 좋아해. 소화가 잘 안되거든."
"나도 페퍼로니보다 여러가지 토핑 올라간 게 좋더라구요."
점심시간엔 정말 아무 얘기나 하게 되는 것 같다. 혼자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아무 얘기라도 하고 나니 뭔가 불편했던 게 좀 사라진 느낌이다. 사람 마주치는 게 훨씬 편해진 느낌? 사람들도 나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묻는다.
"그런데 이전 사무실로는 언제 돌아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오늘 들었는데 공사가 6년... 아니,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래요."
"하하! 그럴 줄 알았어. 6개월은 무슨, 아마 1년일거야. 너 말대로 6년 걸릴 지도 몰라."
말이 헛나와서 6개월이라고 해야 할 것을 6년이라고 말했더니, 옆사람이 실소를 터뜨리며 웃는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공사를 오래 하는 것이 당연한 모양이다.
나만 혼자서 며칠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로군... 역시 한국사람 마인드 어디 안 간다.

"그나저나 어떻게 살던 곳을 다 버리고 짐가방 끌고 올 수가 있니? 젊으니까 그런가? 삶을 다 버리고?"
"막상 닥치면 하게 되요. 힘들었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났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왔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랑도 상관없다.
그냥 처음엔 캐나다가 어떤가 궁금해서 왔다. 6개월 정도 어학원을 다녀보고, 막상 살아보니 신기하고 새로운 게 많았다. 조금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보다가 직업학교를 다녔는데, 직업학교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 판데믹이 터졌다.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냥 버티다 보니 그 직업학교 졸업장으로 공무원이 될 줄이야.
인생은 참 한치 앞을 모를 일이다. 4년 전만 해도 퀘벡 몬트리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부루마불에서나 봤던 도시인데... 눈 오는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살 줄은 상상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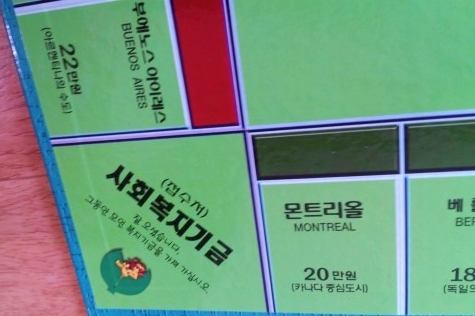
'몬트리올 생활 >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눈폭풍 후 다음 날의 따스함 (14) | 2022.01.19 |
|---|---|
| 따끈한 펜넬차와 얼음물 (17) | 2022.01.18 |
| 점심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14) | 2022.01.13 |
| 책 나눔 박스를 살펴보다가 횡재했다 (12) | 2022.01.12 |
| 춥다! 추울 땐 산책 어떻게 할까? (10) | 2022.01.11 |




댓글